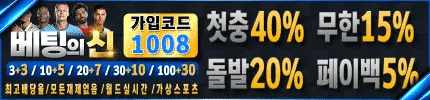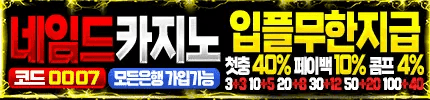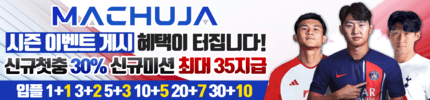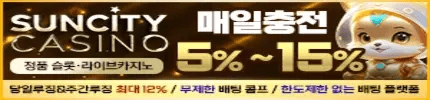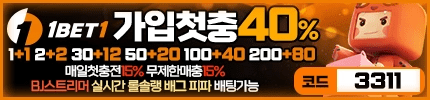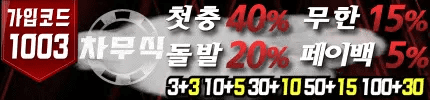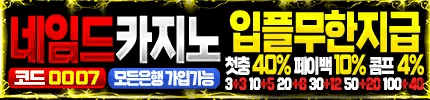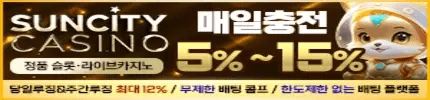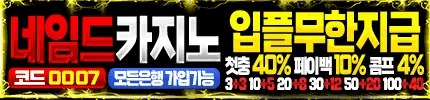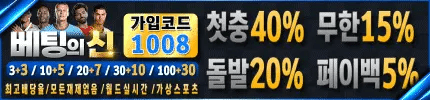(불륜야설) 훔쳐본 아내의 일기장 - 하편

0000년 0월 0일
남편과 3개월 만의 섹스
남편은 혼자서 컴퓨터에 안자 몰 열심히 보더니 갑자기 내 손을 잡고는 침대로 간다.
윗도리도 안 벗고 바지와 팬티만 내리고는 빨아 달란다.
서서히 커지는 남편의 성기, 그러나 힘이 없다. 예전에 딱딱함은 간데없고 발기된 것이 흐물흐물 물렁거린다.
나에게 누우라는 남편.
내 바지와 팬티를 벗기더니 집어넣으려 애를 쓴다. 아직 난 준비 안 되었는데.
내 질구는 말라서 뻑뻑하다. 아픔이 몰려온다 그래도 억지로 집어넣으려는 남편.
난 손에 침을 묻혀서 내 질구를 문지른다.
남편의 성기를 잡고 간신히 삽입되었다.
살며시 내 질 안으로 들어 온 남편 성기. 애간장이 탄다.
혼자 헉헉거리는 남편.
나도 느끼려 애를 쓴다.
느낌이 없다. 질구 입구에서만 깔짝대는 남편 성기.
난 그를 떠올렸다. 내 질 안은 온통 쑤셔 놓았을 그의 성기.
점차 내 입에서도 신음이 흐른다.
몰입되려는 순간. 갑자기 작아지면서 남편의 정액이 질구를 더럽힌다.
난 남편의 정액을 깊숙이 받으려 남편을 끌어안는다.
남편은 아무 소리 안구 성기를 꺼내더니 후지로 닦고서는 바지 입고 나간다.
난 또다시 슬픔이 밀려온다. 아니 화도 난다. 강간당하는듯한 기분 마저 든다.
다시 밀려오는 그의 생각.
난 질구에 흐르는 남편의 정액을 손에 묻혀서 자위를 한다.
그 품에 안겨서 울부짖던 그날을 생각하면서.
드디어 오르가즘이 날 적신다. 난 베개를 끌어안고 울고 말았다.
처참한 느낌이다. 이렇게 살아야 하나.
0000년 0월 0일
매일 하던 그와 채팅을 이틀째 못했다.
그는 처가에 3일간 갔다 온다고 했다. 그래서 전화도 못 하고.
처음으로 그 부인에게 질투가 난다.
그와 만난 지 3일째, 그와 채팅 못한지 이틀째. 그래서 더 힘든가 보다.
아직도 내 질구를 온통 쑤셔대는 그 성기 느낌이 아래에서 슬금슬금 몰려온다.
내 몸에서 땀을 뚝뚝 떨어뜨리며 펌프질하던 그가 너무 그립다.
이 밤에 그는 자기 부인과 그렇게 섹스할 것 같다.
이젠 그 부인이 밉다. 내 자리에 그 부인이 있는 것 같다.
난 남편을 바라보았다. 뭔 술을 그리 마셨는지 정신도 못 가누고 와서 자는 남편. 지금의 내 맘을 알까.
남편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빨았다.
잠결에 내 머리를 밀어 버리는 남편.
난 내 아래서 흐르는 애액 때문에 더 미치겠다.
또다시 남편을 곁에 두고 하는 자위, 전에는 이 자위로 만족하고 살았는데.
자위하니 더 남자가 그립다.
강하고 딱딱한 남성의 성기, 내 몸을 뚫고 들어와 날 즐겁게 해주는 진짜 남자의 성기가 그립다.
0000년 0월 0일
어제 밤새 꿈을 꾸었다. 외간 남자 품을 알아서 그런지 한 번도 꾸지 않았던 꿈이었다.
얼굴도 모르는 남자들과의 섹스. 한 남자가 내게 욕정을 풀면 다른 남자가 또 와서 욕정을 풀고.
난 더 오라 소리치면서 몇 명인지도 모르는 남자들과 섹스. 밤새 꾸었던 꿈이다.
내 아래 계곡은 정사 꿈에 더 질척인다. 이 찝찝한 느낌. 하고 싶어 미치겠다. 하면 개운할 것 같다. 그는 내일이나 연락되고, 도저히 참기 힘들다.
난 채팅을 했다. 30대 초반의 사내.
너무 재미난다. 섹스 농담을 그렇게 재미나게 하는 사람은 첨이다.
그 사내 덕에 한껏 웃기도 했다.
그렇게 오전 시간을 채팅했다.
누나 누나 하면서 따르는 게 귀엽기도 하다. 역시나 채팅 끝 무렵에 만나자는 사내. 점심 식사하잔다.
난 늘 그러면 채팅 창을 닫고 나왔는데 오늘은 갈등이다.
내게 핸드폰 번호를 주면서 전화해달라는 그 사내.
나는 대답을 못 하고 번호만 메모지에 적고는 창을 닫았다.
한참을 고심했다. 재미있는 사람이고 악의는 없는 듯하다.
그냥 점심 먹자는데 나갈까? 난 어느 순간 그 사내에게 전화하고 있다.
네 **자동차 ***입니다.
참 목소리 우렁차고 밝다 느낌이 좋았다.
어느덧 그 사내와 만나기로 약속했다. 우연히도 같은 동네는 아니지만 가까운 거리가 집이란다.
그와 약속한 곳은 늘 가보고 싶었던 일식집. 너무 비싸 엄두가 안 나던 곳인데.
이상하게도 그 사내와 만나러 갈 때 입은 옷이 그와 만날 때 입었던 노랑 원피스.
앞 단추를 풀면 다 오픈되는 허리가 잘록한 원피스를 입고 나갔다.
자동차 영업 사원이라고 소개하는 그 사내는 남동생보다 2살이나 어린 31살이란다.
크지 않은 키에 총명해 보이는 눈빛이 열심히 일하는 30대 초반의 셀러리맨 보습이다.
생선회에 청하 몇 잔을 했다. 얼굴이 뜨거워지는 게 발그스레 해진듯하다.
그 사내는 연신 우수 게 소리로 날 즐겁고 편하게 해주었다.
재치 있는 성적 농담에 난 술기 운 덕인지 좀 대담해지고 촉촉해진다.
상아래서 허벅지와 우연히 부딪친 그 사내의 발, 내 허벅지에는 짜릿한 전율과 함께 내 계곡은 움찔 한 움큼 애액을 토하는 듯하다.
사내는 내 허벅지에 닿은 발을 치우지 않고 그대로 지그시 눌러 온다.
난 손을 내려 사내의 종아리를 만져 본다.
거친 종아리 털 느낌이 너무 좋다. 딱딱한 알통 근육이 날 더 자극 시킨다.
난 그 사내의 종아리를 쓰다듬었다. 사내는 일어나서 내 옆으로 온다.
그리고는 내 원피스 단추를 하나하나 풀어낸다.
가슴을 다 풀어 제친 후 사내는 내 브라를 위로 올리고 두 개의 젖무덤을 만지기 시작했다.
이미 난 팬티가 젖을 정도로 아래가 애액으로 넘쳐난다.
사내는 내 유두를 베어 물고는 입안에서 굴린다.
이 짜릿함이야.
난, 마치 아이 머리를 받치듯이 사내의 머리를 받쳐주고 있다.
36살 아줌마 젖가슴치고는 처지지 않고 크다고 칭찬한다.
내 유두를 물고 있는 사내가 귀엽다.
한참 내 유두와 젖가슴을 애무하던 사내는 내 원피스 단추를 어느새 다 풀어냈다.
팬티를 벗기려는 사내.
아무리 밀폐된 일식집 방이라지만, 누군가 들어 올까 봐서 겁이 난다.
난 사내의 손길을 밀쳤다. 사내는 귓속말로 아무도 안 들어온다고 했다.
그래도 여기서는.
사내는 씩 웃으며 누나는 되게 순진하단다. 5살이나 어린 남자에게 듣는 순진 하다는 말.
사내는 손을 내 팬티 계곡 속으로 쑥 넣어서 내 계곡을 한번 쓰다듬고는 내 단추를 다시 채워준다.
"누나. 물 엄청나게 나왔네. 그리고 털 무지 무성해. 누나, 섹스 무지 좋아하지?"
그 말에 난 또 한차례 애액을 뿜는다.
사내와 일식집을 나섰다. 난 사내 뒤를 말없이 쫓아갔다.
내가 사는 동네는 아니지만, 집과 멀지 않은 곳이라 우린 모르는 사람처럼 사내가 앞서고 난 뒤를 따라갔다.
누가 볼까 두려움에 그를 따라간 곳은 오피스텔. 사내가 사무실 겸 집으로 사용하는 곳이라 한다.
낯선 사내 집에 방문. 조금 두렵기도 하다.
방안에 들어서자마자 사내는 내게 달려들어 내 원피스를 벗겼다.
감탄하는 사내. 애 엄마의 몸 같지 않다고 한다. 입바른 소리로 들려도 이쁘다니 기분 좋다.
날 그렇게 새워서 속옷가지 다 벗긴 후 사내는 내 귓불부터 애무해 나간다.
사내의 혀가 뱀처럼 내 몸을 휘감기도 하고 핥아주는데 내 온몸의 솜털조차도 그걸 느낄 수 있었다.
어느덧 내 계곡에 다다른 사내의 혀는 울창한 내 숲을 헤지며 혀로 음핵을 핥아준다.
난 그 짜릿함에 다리를 꼬고 사내는 연신 내 허벅지를 벌리고.
눈감고 그 느낌을 즐기던 나는 문득 눈을 뜨니 창밖으로 건물들이 보인다. 마치 공개된 장소에서 나체로 애무 당하는 기분.
사내는 밖에서는 안 보인다고 한다. 그래도 느껴지는 노출의 느낌. 더한 자극으로 내게 온다.
사내는 내게 자기 옷을 벗겨 달라고 한다.
그리 크지 않은 체구지만 탄탄해 보이는 젊은 몸.
나도 사내처럼 귓불부터 애무했다.
입안에 가득 들어오는 사내의 성기. 그와 같이 크고 해바라기는 아니지만 딱딱하고 배에 달라붙을 정도로 솟아 있는 성기의 느낌 너무 좋았다.
귀두를 물고 사탕같이 입안에서 이리저리 굴리며 사내의 불알을 쓰다듬었다.
쌀 것 같다고 울상 짓는 사내가 너무 귀엽다.
사내는 침대 위에 나를 눕히고 내 몸 위에 포개져 온다.
난 다리를 한껏 벌리고 사내가 들어 오기만 기다린다.
사내는 내 질구 입구에 귀두를 대고는 살짝 넣었다가 뺐다가 한다.
미칠 것 같다. 귀두가 반쯤 들어 오면 나가고.
"나 미치겠어! 빨리 넣어줘."
"머 넣어줘? 누나?"
"그거 넣어줘."
사내는 날 애달게 만든다.
"네 것 넣어줘."
"누나 거기에 동생 것 들어간다."
깊숙이 들어 오는 사내의 성기 딱딱함에 찔리는 듯하다. 사내는 깊숙이 넣은 체 치골끼리 부딪치는데 그 느낌이란.
사내는 연신 말을 많이 한다.
"누나 죽여준다. 나 어때? 죽이게 조이는데, 연하 맛 좋아?"
그 말에 난 또 녹아내린다.
첨에 그 사내가 하는 말이 쑥스러웠는데 이젠 자연스레 들린다. 나도 모르게 "미칠 것 같아"하고 나와 스스로 놀라기도 했다.
"누나. 느끼면 다들 그런 소리 해. 소리 내야 좋지."
난 맘껏 음탕한 소리를 질러 댔다.
애액이 너무 흘렀는지 질컥질컥하며 사내가 펌프질할 때마다 들렷다.
내 두 다리를 붙이게 하고 사내는 내 허벅지에 올라타 삽입하는데 질구 입구에서 느껴지는 사내의 귀두 날 미치게 한다.
처음 해보는 체위 꼿꼿한 사내의 성기가 고스란히 느껴지면서 내 음핵을 자극해 난 사내를 끌어안고 계속 밀려오는 오르가즘에 소리를 지른다.
"누나. 나 쌀 것 같아. 동생 물이 누나 거기에 들어가도 돼?"
난 사내의 그 소리가 싫지 않다.
"난 응! 싸줘. 내 거기에, 누나 거기에 물 가득 부어줘."
난 사내를 끌어안았다.
젊어서 그런지 엄청난 양의 액이 질 안으로 밀려들어 왔다. 3번 4번 아니 7번 정도 뿜어내는 듯했다.
사내는 사정 후 그대로 누워서 내 얼굴을 쓰다듬어 주었고 "누나, 누나." 하며 연신 좋다고 외쳐 됐다.
사내는 휴지로 성기를 닦고는 내 성기를 세심히 닦아 주었다.
오피스텔이라 샤워하기 마땅치 않아 일어나 옷을 입으려 하는데 얼마나 많이 사정했는지 사내의 액이 쭈르르 흘렀다.
사내와 난 그것을 보고 한참을 웃었다.
사내는 내게 키를 하나 주면서 오고 싶을 때 언제든지와 한다.
난 몇 번 사양했다가 키를 받고는 사내의 오피스텔을 나왔다.
집까지 걸어오는 동안 질 안에 고여 있던 사내의 정액은 움찔거릴 때마다 흘러내렸다.
그동안 개운치 않았던 몸은 사내와의 정사로 개운하고 상쾌했다.
0000년 0월0일
남편과 아들 아침도 못 차려주었다. 남편이 대강 챙겨 먹고 출근한 듯.
밤새 몸살로 정오 때나 일어날 수 있었다. 빈속이지만 찐한 커피 향이 그리워 베란다에서 커피를 마신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건지.
3년간 남편과 10번도 안 되는 섹스를 해왔는데.
지난 4일간 열 살 위의 40대 중반 남자와 3번의 섹스
그리고 5년 연하 남자와 1번의 섹스.
마지막으로 남편과 섹스 같지 않은 섹스.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다.
잘 참고 살아온 지난 3년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새로운 세상을 보여준 남자들이 고맙기도 하다.
창 너머로 떠올려지는 남편. 왜 남편은 지병으로 날 이렇게 만들었는지.
간혹 술 마시고 들어와서 내게 미안하다고 말만 되뇌는 남편 모습.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도 든다.
남편과 아들이 이 사실을 안다면 얼마나 충격일까.
참 성실히 살아온 남편과 우리 가정인데, 남편과 아들에게 실망과 슬픔을 줄 수 없다.
나 자신을 찾아야지.
0000년 0월 0일
오늘은 정말 참기 힘들다.
아들과 남편이 좋아하는 꽃게탕을 해주려 장을 보러 갔는데, 스치는 남자들의 시선이 내 알몸을 보는 듯하다.
아니. 모든 남자가 알몸으로 성기를 빳빳이 세우고 내게 빨아달라고 하는 듯하다.
심지어 전에는 그냥 스치듯 인사했던 경비 아저씨까지 남자로 보인다.
며칠째 핸드폰도 꺼놓고 컴퓨터 근처에도 안 갔다.
몇 번이나 핸드폰을 켜려다가 도로 내려놓았다.
컴퓨터를 켜려다가 눈물을 삼키기도 했다.
티브이에 남자배우 목소리만 들어도 찌릿한 느낌과 화끈함을 느낀다.
더더욱이 내 계속 질구는 움찔거리면서 전에 내 안을 가득 채워 주었던 그 남자들을 그리워 하는듯하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남자의 목소리만 들어도 한 움큼의 애액을 뿜어 댄다.
대낮에 거실에서 자위도 수없이 해보았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그리워지는 빳빳하고 큰 성기들.
한 번만,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하고 싶어진다.
내 안을 딱딱하고 빳빳한 굵은 성기가 쑤셔대는 느낌을 딱 한 번만 느끼고 싶다.
그럴 때마다 남편과 아들 얼굴을 떠올려 본다.
내 욕망과 현실과 윤리에서 난 오늘 또 울음 속에 산다.